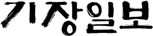‘섬진강 시인’으로 익히 알려진 김용택 시인은 ‘도드라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했다. 뽐내고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삶보다는 자연의 순환, 생태 이치를 따르고 지키는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드라지려고 하다보면 보여 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은 때론 ‘어울림’을 방해한다는 것.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라북도 임실군 두레마을에서 김용택 시인을 인터뷰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연 다니고, 집에 이렇게 있고, 손님들 찾아오고, 숨어 있어요. 시인의 집이라고 사람들 찾아옵니다. 담을 건너오지 말라는 뜻으로 안채 입구에 대나무로 담을 쌓았는데 넘어들 와요. 밤이 되면 숲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요. 누워 있으면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집은 언제 지으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건축을 얘기할 때 전통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이란 없는 거죠. 전통은 만들어가는 것인데 흔히들 고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구입하기 쉽고 찾기 쉬운 걸로 짓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인의 집’ 설계도 직접 하셨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제시한 설계가 있었어요. 집이 크고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건축자재들도 이질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저런 집들 작잖아요. 우리 집만 크게 드러나면 위압감이 생겨요. 파벽돌을 이용해 집이 작아보이도록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집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지나쳤다 다시 찾아오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했어요. 도드라지면 안 되고 위화감 주면 안되요. 시골 풍광하고 잘 어울려야 합니다. 스며들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사람이 고민해서 지었어요. 정원의 돌도 여기 돌이예요. 농사짓던 사람들이 논밭에서 돌을 주어 담을 쌓듯 돌담을 쌓았어요.”
-시인의 집도 선생님의 시처럼 자연을 닮았네요?
“저는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이념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작은 마을에서 중요한 것은 어울리는 것이죠. 정면에서 보면 집이 작아요. 집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담겨 있어요. 한국화를 보면 사람과 집이 작아요. 사람이나 나무나 집이나 크기가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한국화에 담겨 있어요.”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에도 뽐내고 과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신적 결핍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릅니다. 높고 큰 건축은 어쩌면 폭력에 가까워요. 나중에 처치 곤란해 질 것도 같아요. 또 삶을 결핍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순환, 생태에 이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이곳에 가만히 있어보면 삶이 평화로워요.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아름다움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편하게 와서 둘러보고 들마루의 차 한 잔 하고 선생님 뵙고 가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과시하려고 해요. 내 시를 외운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남 얘기 할 때 듣지 않고 크게 웃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땐 ‘얘기 좀 들읍시다’라고 말하 곤합니다. 교양이란 같은 문법으로 서로 대화하고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남북대회, 북미대회죠. 큰 문제이고 난제인데 문제인 정부가 차분하고 차근차근 순리에 따라 해결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정직해 보입니다. 여지 것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했잖아요. 저마다 힘들게 사는데 나라 걱정은 벗어난 듯해요. 정치적 안정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경제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한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경제적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정직이 제도화 되었으면 해요. 이 정부가 그런 걸 하나하나 씩 해결해가는 걸 보면 조금은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종영된 드라마 도깨비에서 선생님의 책이 인용돼 화재를 모았었습니다.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란 책이었어요.
“도깨비 이슈가 되면서 제가 엮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김은숙이라는 작가가 드라마 극본을 썼고 공유가 책의 낭송해 화제를 모았죠. 제가 낭송했으면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공유가 낭송해 사람들이 쿵 했죠. 하하하.”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날 아이들이 놀러 와서 시를 어떻게 쓰게 됐냐고 묻길래 심심해서 시를 썼다고 답했습니다. 심심하면 모든 게 보여 심심하지 않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나뭇가지가 자세히 보이는 것과 같은 얘기죠. 저는 문학이라는 고정관념이 싫습니다. 시인, 문인이라 구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시인은 학처럼 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살다보니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읽다보니까 글을 쓰고 됐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인이 되어 있었죠. 만일 시를 안 쓰고 나무나 풀처럼 살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시를 쓰는 게 때론 불편해요.”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힘들게 살아왔는데 뭐더러 돌아봅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지금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생일 날 음식을 먹으려고 여러 날 굻었는데 생일날 죽었다면 허무하잖아요. 희망과 꿈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꿈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며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선량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이제 달라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도권 교육은 완전히 믿기 힘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교육이요?
“저는 희망을 시민교육에 걸어요. 우리들이 오래 살게 되요. 우리들은 적어도 100세 아이들은 120세 까지 살거예요. 삶을 잘 갈무리해서 국가적으로 이용해야 해요. 독일은 시민교육이 참 잘 되어야 해요. 퇴근 하면 대게 시민들이 시민대학에 가요. 약 1000개가 있어요. 통일 되자 마자 각 도시에 시민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정기과정을 해요. 석사 주고 박사도 줘요. 그 시민대학에서 오래 사는 노령화된 인구를 흡수해서, 또 퇴근한 사람들의 일과를 흡수해서 교육해요. 시민의 힘을 길러요. 그 시민들이 국가와 자본을 견제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가죠. 그게 바로 시민교육이죠. 요 금방에 있는 귀촌귀농한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오셔서 놀아요. 글을 써요. 가르치는 건 아니고.”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추천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니. 요즘 하우게의 시집을 즐겨봅니다. ‘어린나무의 눈을 털어주다’요.
-아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불을 왜 내가 게 야 해’ 신혼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머리가 번쩍 깼어요. 아내가 ‘밥 먹어야 해’ 말하면 조용히 숟가락을 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용서를 빌고요.”
-책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얘기는 뭔가요?
“1995년 아내가 오더니 ‘여보 책 외상값 다 갚았어요’라고 하더군요. 1982년부터 책을 외상 했는데 서점주인이 어느덧 절 알아봤어요. 외상값 다 갚았다는 애기 듣고 ‘만세’를 외쳤죠.”
-글은 왜 써야 할까요?
“누구나 혼자 살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글이 뭐 소용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 글을 쓰면 잊혀집니다. 글을 쓰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아내에게도 글을 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