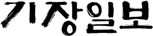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설날엔 시동생도 아들네도 오지 못할 것 같다. 남편은 우리끼리 설을 지내야 하니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한다.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허전한 마음이다.
오래전 아이였을 때 설날이 다가오면 그저 신이 났다. 설이 다가오면 동네에서 소를 잡아서 나누었다. 소건 돼지건 명절 무렵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잡으니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건넛방 가마솥에 장작을 지펴서 사골을 끓이면 뽀얀 국물이 설설 끓었다. 석쇠에 구워 먹던 불고기는 정말 맛이 있었다.
식혜를 만들고 엿을 고고 두부를 만드느라 계속 불을 지펴서 뜨거워진 방바닥을 깨금발로 살금살금 다녔다. 가래떡을 뽑아서 머슴 아저씨가 지게에다 지고 오면 긴 가래떡을 한 가닥씩 들고 금방 만든 조청에다 찍어 먹었다. 송홧가루와 미숫가루 반죽을 다식틀에다 넣고 꾹꾹 눌러 다식을 만들고 콩과 깨를 볶아 콩강정, 깨강정을 만들면 오도독 깨물어 먹는 재미가 좋았고 한동안 단맛에 푹 빠졌었다.
방 한구석엔 노란 움파가 자라고 까만 보자기를 씌운 시루 속엔 노란 콩나물이 자라고 있었다. 한밤중에도 할머니가 콩나물시루에 조르르 물주는 소리를 잠결에 들었다. 궁금해서 까만 보자기를 젖혀보면 콩나물은 쑥쑥 노랗게 올라왔다.
머슴 아저씨는 절구에 찰밥을 넣고 찧는다고 힘자랑을 하고 노란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는 쉴 새 없이 입으로 들어갔다. 밤이면 딱딱하게 굳은 가래떡을 써느라 엄마 손은 부르텄다. 잘 익은 김장김치와 돼지고기를 다지고 두부와 숙주나물을 넣고 만두 속을 만들고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만두를 빚었다. 어른들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기다려지는 설날이었다.
설날 아침 사골국물에 끓인 떡만둣국은 참 맛있었다. 세배 손님이 오면 떡국을 끓이거나 화롯불에 인절미를 구워서 집에서 빚은 동동주며 술상을 봐서 들여가곤 했다. 아이들 세배 손님에겐 강정과 과일 등 다과상을 차렸고 세뱃돈 대신 사탕이나 과자를 줬다.
세상이 바쁘게 변해가도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설이면 찾아와서 할머니께 세배했다. 누가 세배를 오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리나보다 하고 할머니는 걱정하셨다. 정월 초사흘이면 떡국을 끓여서 동네에 돌렸고 오지 못하는 분들에겐 한 그릇씩 퍼서 날라야 했다.
하지만 내가 주부가 되어서 생각하니 할머니야 오는 손님 받기만 하셨으니 모르겠지만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없었던 그때 엄마는 그 일들을 어찌 해내셨을까. 나의 시어머님도 정월 초사흘이면 떡국을 끓이라고 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셨다. 설이 지나고 다시 떡국 잔치를 해야 하는 일들이 때론 귀찮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다.